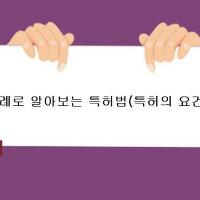개봉하는 영화만 해도 매년 1편씩이다. 눈 뜨고 있는 매 시간 각본쓰고 영화를 연출해야만 가능할 일일텐데도 81세 노장은 쉴 틈 없이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우디 앨런의 영화는 몇 가지 형식적인 공통점이 있다.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재즈음악, 오프닝과 엔딩을 장식하는 우디앨런스러운 윈저(Windsor)체, 90여분의 상영시간, 고전영화 같은 연사의 내레이션, 대본은 어떻게 다 외울까 궁금할 정도로 수다스러운 인물들,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스꽝스러운 느낌들. 그러한 틀 안에서 인생에 대한 우디앨런의 시각은 그간 대체로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경우가 많았다.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꿈 같은 헐리웃, 꿈 같은 인생
2016년도 86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카페 소사이어티>는 아름답고 씁쓸한 느낌을 자아내면서도 전반적으로 꿈 같이 느껴지는 영화였다. 나른한 영화적 색감과 헐리웃의 황금기인 1930년대를 화려하게 조명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인공들이 삶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성공의 꿈을 품고 LA로 온 뉴욕남자 바비(제시 아이젠버그)는 헐리웃의 거물 삼촌 슈테른(스티브 카렐)의 에이전시에서 일하면서 삼촌의 비서 보니(크리스틴 스튜어트)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보니는 삼촌과 불륜 관계였고, 보니가 갓 이혼한 삼촌과의 결혼을 택하면서 바비의 LA 생활은 막이 내린다. 뉴욕으로 돌아온 바비는 갱스터인 형이 살인을 통해 얻게 된 한 클럽을 사교계의 최고급 명소로 탈바꿈시킨다.
그리고 클럽에서 만난 동명이인 보니(블레이크 라이블리)와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된다. 삼촌과 숙모가 된 보니가 뉴욕을 방문하면서, 바비는 또 한번 그녀에게 흔들리지만 결국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화려한 연말 파티가 진행되는 가운데 바비와 보니의 몽롱한 눈빛으로 영화는 마무리 된다. 이루지 못한 옛사랑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을 이룬 현실의 안락함은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눈빛은 허망해보이기도 하고, 꿈처럼 아련해보이기도 한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한다
얼핏 보면 1930년대 헐리웃판 위대한 개츠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바비는 철저히 목적지향적이고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이상주의자에 가까운 개츠비와 많이 달랐다. 주인공들은 (자기들이 영화 속 인물들임을 망각이라도 한 것 처럼) 운명의 장난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바비는 열렬히 사랑한 보니가 숙모가 된다는 사실을 순진하게도 가장 마지막으로 알게 되고, 알고난 후에도 삼촌에 대해 악의를 갖거나 낙담해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보니를 되찾겠다고 어떤 일을 비장하게 감행하거나, 복수를 꿈꾸는 모습 등은 나오지 않는다. 요컨대 <카페 소사이어티>에는 극적인 장치와 상황은 있어도, 극적인 인물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 이따금씩 생겨나는 파도에 맞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어떤 때는 순진하게, 어떤 때는 우직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
인생은 원래 그런거야
영화가 주목한 것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되는 인물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청운의 꿈을 안고 헐리웃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바비는 원칙를 중요시 여기는 순진한 젊은이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헐리웃에 환멸을 느껴 도망치듯 떠났으면서도 뉴욕에서 새로운 유흥의 세계인 '카페 소사이어티'를 운영하며 이름을 날린다. 옛 연인 보니에게 흔들리면서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부인 보니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등 바비는 큰 불협화음 없이 자신의 삶을 조종해나간다. 바비의 가족들은 또 어떠한가. 살인과 폭행 등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문의 부를 축적해온 바비의 형이 사형에 처해지지만 결국은 그가 벌어 놓은 돈으로 다시 잘 먹고 잘 살게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알 수 없이 많은 우연과 아이러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도, 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다. 그러기에 주어진 현실을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는 것 말고는 최선의 대응책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가학적인 작가가 쓴 코미디(Life is a comedy written by s sadistic writer)라는 바비의 말은 곧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노장 우디 앨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에 대한 훈수인 셈이다.
영화관에서는 GV(Guest Visit)라는 이름으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들도 진행된다. 지난 9월 압구정에서 김도훈 허핑턴포스트편집장과 모델 이영진이 함께 ‘1930년대 패션스타일과 헐리웃의 분위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930년대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암울했어도, 패션부문에선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였다. 오늘날과 같은 코르셋과 브래지어가 등장한 시기니만큼 당시 패션은 여성적인(feminine) 스타일이 많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 영화 속 보니(크리스틴 스튜어트)는 프릴(frill)이 들어간 옷을 다양하게 입고 나오는데, 이는 페미닌 스타일을 대표한다. 특히 카페 소사이어
티에서 보니(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입고 나오는 화려한 드레스들은 오늘날 입어도 손색이 없을만큼 세련되고 화려하다.
+ 이번 영화로 우디 앨런의 영화가 궁금해졌다면, 케이트 블란쳇의 편집증적인 연기가 돋보이는 <블루 재스민>을 추천한다.
'KIST Talk > 사내직원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슐랭의 가이드투어]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0) | 2016.11.04 |
|---|---|
| [알기쉬운 지식재산권법] 판례로 알아보는 특허법 : 특허의 요건 1(원세환 기자) (0) | 2016.10.18 |
| [사회공헌활동] 윷! 나와라 모! 나와라 신나는 척사대회(정인숙기자) (0) | 2016.10.13 |
| [고슐랭의 가이드투어] 여름특집 ‘하하하하와이 와 꿈’(고세환 기자) (2) | 2016.07.14 |
| [사회공헌활동]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원한 여름나기” (정인숙 기자) (1) | 2016.07.06 |